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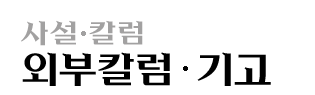 |
| [아침논단]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 | ||
최근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두 편의 우리 영화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한편에서는 두 영화가 모두 용공(容共)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두 영화를 모두 본 나는
이 같은 논란이 이들 영화가 관객에게 제공하는 대리만족의 맥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공통점은 두 영화 모두 우리 현대사의 가장 아픈 상처, 즉 분단(分斷)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는 사실이다. ‘실미도’가 분단이 초래한 국가의 폭력에 편승한 개인이 겪는 집단적 좌절을 그리고 있다면, ‘태극기 휘날리며’는 전쟁이라는 객관적인 구조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처한 형제가 겪는 갈등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두 작품 모두 분단이라는 거시적인 구조가 개인의 미시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섬세하게 묘사한다. 분단이 제공하는 정서적 우물의 깊이는 이미 관객 600만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쉬리’와 ‘공동경비구역 JSA’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전쟁이 남긴 한국 현대사의 상처는 아마도 강제규 감독의 말처럼 영화 100편의 소재로도 모자랄지 모른다. 분단은 앞으로도 영원히 한국 영화의 거시적 소재로 남아 개인의 미시적 정서를 주워 담는 저수지로 기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영화가 얼마나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가를 따지는 문제는 그 영화에 담긴 주인공의 미시적 삶에 관객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판가름될 뿐이다. 두 영화는 모두 남자들만의 세계를 소재로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정서적 지향은 관객 820만명을 동원한 ‘친구’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오늘날 전우애·형제애와 같은 고전적인, 아니 남성적인 ‘커밍아웃’이 감동을 주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를 왜소화된 남성의 카타르시스라고 해석하면 무리일까. 관객이 안고 사는 시대의 좌절을 영화가 카타르시스해주는 기능은 분명 중요한 흥행의 조건이다.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대리만족을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는 관객에게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우파에는 ‘김일성의 목 따는 일’을 했어야 한다고 암시하기도 하고, 좌파에는 우파도 인민재판을 했다고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극기 휘날리는 삼일절, 실미도라도 방문하며 오늘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유석춘/연세대 교수·사회학) |
||
| 입력 : 2004.02.29 17:40 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