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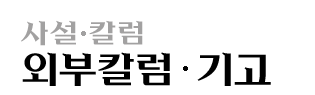 |
| [시론]‘로또’ 대학입시 柳錫春·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입력 : 2004.10.10 18:38 37' / 수정 : 2004.10.10 18:39 21' |
||
일단 일반계 고등학교만을 기준으로 간단한 계산을 몇 가지만 해 보자. 이들 학교에는 어찌됐든 고3 학생들 가운데 가장 공부 잘 하는 학생이 문과와 이과에 각각 1명씩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전국적으로는 문과와 이과에서 학교별로 가장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각각 1351명씩 존재한다. 물론 이들은 모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내신은 당연히 1등급이고, 나아가서 수능 또한 1등급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관한 주관적 기대치를 한번 따져보자. 예컨대 자신이 속한 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주위에서도 그렇다고 인정하는 문과의 고3 학생이 대학을 진학할 때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당연히 가장 경쟁력 있는 대학의 가장 경쟁력 있는 전공에 진학할 수 있다고 믿을 터이다. 보다 구체적인 현실에서 일반적인 경향으로 말하면 1351 명의 문과 1등 학생이 모두 서울대학교의 법과대학에 진학하려 한다고 해도 과언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정원은 205명뿐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6.5대1의 경쟁을 거쳐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의 입시제도는 이들을 변별할 적절한 장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고교 간 학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 지원자의 전국적인 수학능력 평가를 단지 9단계 등급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접’이나 ‘수상경력’ 혹은 ‘논술’ 등의 보조적 방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 부작용 때문에 이들 장치를 가지고 전국의 1등 학생 1351명을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게 차별화시키는 작업은 아무래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방법이 전혀 없는가. 있기는 있다. 추첨 즉 ‘로또’로 학생을 뽑으면 된다. 결국 한국 최고의 경쟁력 있는 대학의 학생, 즉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인력을 우리는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가려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을 조금 더 확대해 각각의 고등학교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여기에 합세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왜냐하면 이들도 내신과 수능이 모두 1등급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가 보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9월 마감한 수능 응시자는 모두 61만146명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수능 1등급, 즉 응시자 가운데 상위 4%의 범위에 포함될 학생의 수는 2만4406명이다. 이들은 물론 과목별로 분류되는 내신에 다소의 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 최상위 집단에 속하는 능력을 가진 학생들일 것이다. 세 번의 복수지원이 허용된 제도에서 5000명 내외의 정원을 가진 대학이 이들을 객관적으로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다. 결론은 역시 ‘로또’뿐이다. 만약 전국의 대학이 모두 평준화되어야 한다는 교육철학에 국민들이 동의하면 ‘로또’에 의한 방식이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국민들의 지배적 의견이 우리도 세계적인 수준의 명문 대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로또에 의한 입시는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 지식기반 사회의 경쟁력 원천이 결국 대학일 수밖에 없음을 생각하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너무도 자명하다. |
||
